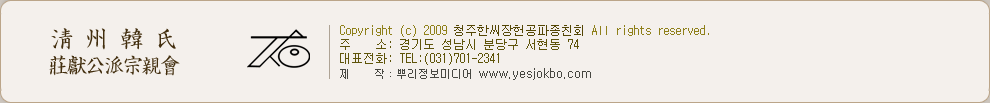국조보감(國朝寶鑑) 68권, 별편 7권에 수록된 《사조보감(四朝寶鑑)》
국조보감(國朝寶鑑) 68권, 별편 7권에 수록된 《사조보감(四朝寶鑑)》
국조보감(國朝寶鑑) 68권, 별편(別編) 7권 간본 ○ [임인년(1782, 정조6) 편찬]
세종대왕께서 《송사(宋史)》를 읽다가, 국사원(國史院)에서 정사(正史)와 실록(實錄)을 찬진(撰進)한 다음에 다시 조종(祖宗)이 행한 방대한 계책과 중요한 정사(政事)의 내용을 모아서 《보훈(寶訓)》을 찬집(撰輯)하여 이영각(邇英閣)의 강독 자료로 삼은 것을 매우 좋게 생각하고는 “이야말로 본받을 만한 방법이다.” 하시고,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권제(權踶)와 집현전 대제학(集賢殿大提學) 정인지(鄭麟趾) 등에게 명하여 태조(太祖)와 태종(太宗)이 행한 방대한 계책과 중요한 정사의 내용을 수집하여 양조(兩朝)의 보감(寶鑑)을 엮도록 하였으나 끝내 완성을 보지 못하였다. 그후 세조조(世祖朝)에는 세종께서 이루려 하셨던 일을 이루고자 태조, 태종, 세종, 문종(文宗)의 방대한 계책과 중요한 정사를 편집하도록 지시하여, 수찬청(修撰廳)을 설치하고 집현전 대제학 신숙주(申叔舟) 등 5명을 당상(堂上)으로 삼고, 예문관 직제학 한계희(韓繼禧) 등 3명을 낭청(郞廳)으로 삼았다. 7편을 엮어 전문(箋文)과 함께 바치니, 이것이 《사조보감(四朝寶鑑)》이다. 인조조(仁祖朝)에 대제학 이식(李植)의 건의로 《선묘실록(宣廟實錄)》을 개찬할 때에, 하교(下敎)하기를, “실록의 편찬을 끝낸 뒤에 후세의 모범이 될 만한 성인의 계책을 뽑아서 따로 한 책으로 만들어 바치도록 하라.” 하였는데, 이식이 미처 찬진하지 못하고 졸하였다.
숙묘조(肅廟朝)에 공조 참판 이단하(李端夏)가 《선묘실록》에서 자료를 뽑아 보감을 만들어 자신의 아비가 국가에 충성하려던 성의를 이루게 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므로 주상의 허락에 따라 이단하가 집에서 편집하여 차자(箚子)와 함께 바치니, 이것이 《선묘보감(宣廟寶鑑)》이다. 그후 영종조(英宗朝)에 사조(四朝)와 선묘(宣廟)는 보감이 있으나 그 밖의 열성조는 모두 보감이 없으므로 비로소 뒤를 이어 편찬하여 일통(一統)의 문자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일이 중대하고 역사가 커서 마침내 중지되었다. 이어서 찬집청(纂輯廳)을 두고 전 대제학 윤순(尹淳)에게 지시하여 《숙묘보감(肅廟寶鑑)》을 편집하도록 하였으나, 곧이어 장령 신처수(申處洙)가 예설(禮說)과 사문(斯文)의 일을 보감에 기록하지 않았다 하여 윤순을 탄핵하였다. 주상께서 윤순에게 누차 출사하도록 권하였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사성(大司成) 이덕수(李德壽)를 당상관(堂上官)으로 삼아 보감의 편집을 전담하게 하고 부호군(副護軍) 유엄(柳儼) 등 8명을 낭청으로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이덕수 등이 15편으로 엮어서 전문(箋文)과 함께 바치니, 이것이 《숙묘보감》이다.
내가 즉위한 지 5년째인 신축년(1781)에 《영묘실록(英廟實錄)》의 편찬을 마치고 이어서 보감을 편찬하고자 대신과 각신을 불러서 하교하기를, “광묘조(光廟朝)에 보감을 편찬한 뒤로는 다만 《선묘보감》과 《숙묘보감》 두 보감만이 편찬되었고 나머지 열두 임금은 아직도 보감이 없다. 이제 이 기회에 열두 분 임금의 보감을 나란히 편찬하여 앞서 편찬된 세 보감과 《영묘보감》과 함께 한 책으로 만든다면, 선왕의 덕행과 공업(功業)을 선양함과 동시에 선대왕이 마음먹었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일거양득인 셈이다.” 하였다. 그리하여 조경(趙璥), 이명식(李命植), 김익(金熤)에게 명하여 《영종조사실(英宗朝事實)》을 편찬하여 교정소(校正所)로 보내게 하고, 한편으로는 원임 대제학인 이복원(李福源)과 서명응(徐命膺)에게 자신의 집에서 교정하여 보감의 체재로 엮도록 하였다. 《영묘보감》의 편찬이 끝난 다음에 차례로 열두 분 임금의 보감을 편찬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먼저 춘추관(春秋館)의 신하들에게 각조(各朝)의 실록에서 보감을 편찬할 자료를 찾아내도록 지시하였다. 이어서 서호수(徐浩修)는 《정종조사실(定宗朝事實)》, 조경(趙璥)은 《단종조사실(端宗朝事實)》ㆍ《예종조사실(睿宗朝事實)》ㆍ《인종조사실(仁宗朝事實)》ㆍ《경종조사실(景宗朝事實)》, 정창성(鄭昌聖)은 《세조조사실(世祖朝事實)》, 김노진(金魯鎭)은 《성종조사실(成宗朝事實)》, 홍양호(洪良浩)는 《중종조사실(中宗朝事實)》, 서유린(徐有隣)은 《명종조사실(明宗朝事實)》, 민종현(閔鍾顯)은 《인조조사실(仁祖朝事實)》, 김익은 《효종조사실(孝宗朝事實)》, 이명식(李命植)은 《현종조사실(顯宗朝事實)》을 편찬하되, 한 편이 완성될 때마다 계속해서 교정소로 보내도록 하였다. 교정소에서 내용을 취사하거나 증감(增減)할 때는 내각에서 품의하여 지시를 받도록 하였다. 열두 분 임금의 보감과 선조(先朝)의 보감이 차례로 완성되었다. 그다음 해 봄에는 기존의 세 보감을 합하여 의례(義例)를 상호 조정하여 68권으로 만들었다. 인조조 이후의 존왕양이(尊王攘夷)의 의리에 관계되는 내용은 분리하여 7권의 별편(別編)으로 만들었다. 정유자(丁酉字)로 먼저 한 질을 찍은 다음 다시 인본(印本)을 판목(版木)에 번각(飜刻)하여 후세에 길이 전해지도록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열성조의 보감이 비로소 완비되었으므로,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완성된 다음에 세조의 세실(世室)에 바쳤던 고사를 따라서, 책보(冊寶)를 올리는 의식으로 종묘(宗廟)에 고하였다. 이어서 각조의 보감을 각조의 세실에 궤짝에 담아 보관하는 것을 만세(萬世)의 법식(法式)으로 삼았다.
國朝寶鑑 刊本.
친찬서(親撰序)
실록(實錄)과 보감(寶鑑)은 모두 역사책이기는 하지만 그 체재는 다르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의 잘잘못을 모두 써서 명산(名山)에 간직해 두고 천하 만세의 평가를 기다리는 것은 실록이고, 그중에서 중요한 모훈(謨訓)과 공렬(功烈)에 관한 내용을 가려 뽑아 대서특필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서 뒤를 이은 왕의 본보기가 되도록 한 것이 보감이다. 그러므로 실록은 비장(祕藏)하는 것이고 보감은 공개하는 것이며 실록은 먼 후대를 대상으로 한 것인 반면에 보감은 현재 당장 절실한 것이어서 둘 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옛날의 우(虞)ㆍ하(夏)ㆍ상(商)ㆍ주(周)의 역사를 공 부자(孔夫子)가 백 편(百篇)으로 산정(刪定)한 뜻에 비춰 보면 보감이 오히려 그쪽에 가깝다.
그런데 실록은 나라마다 다 있어도 보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도는 광묘(光廟)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전대(前代)에서 찾아보면 송(宋) 나라의 《삼조보훈(三朝寶訓)》이나 《전법보록(傳法寶錄)》, 명(明) 나라의 《조훈록(祖訓錄)》이나 《문화보훈(文華寶訓)》 같은 것이 다 선왕의 덕을 빛내고 후손들을 교도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때그때의 언동(言動)과 덕업(德業)까지 아울러 기록하여 간략하면서도 빠뜨림이 없고 확실해서 증거로 삼을 만하기로는 우리나라의 보감만 한 것이 없으니, 대성인(大聖人)의 제작이 참으로 훌륭하다 하겠다.
현재 편찬된 보감은 3종이 있다. 그러나 《국조보감(國朝寶鑑)》은 태조(太祖)ㆍ태종(太宗)ㆍ세종(世宗)ㆍ문종(文宗)의 4대를 수록하는 데서 그쳤고, 《선묘보감(宣廟寶鑑)》과 《숙묘보감(肅廟寶鑑)》은 각기 한 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후의 여타 임금에게는 미치지 못하였으니, 훌륭하기는 하지만 완비된 것은 아니다. 그 외에 정종(定宗)ㆍ단종(端宗)ㆍ세조(世祖)ㆍ예종(睿宗)ㆍ성종(成宗)ㆍ중종(中宗)ㆍ인종(仁宗)ㆍ명종(明宗)ㆍ인조(仁祖)ㆍ효종(孝宗)ㆍ현종(顯宗)ㆍ경종(景宗), 이 열두 임금의 경우에는 정리해 놓은 모훈이나 공렬이 전혀 없다. 그러니 비록 명산(名山)에 보관해 둔 실록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누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우리 선대왕께서 보감의 보집(補輯)에 뜻을 두고 여러 신하들과 계획을 세웠으나 미처 행하지 못하였다. 그후 내가 뒤를 이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신축년(1781) 9월에 선대왕의 실록이 완성되자 보감을 편찬하기로 의논하였다. 이어서 생각해 보니, 우리 선대왕께서는 효제(孝弟)를 근본으로 삼고 환과(鰥寡)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치를 펴시면서 50여 년 동안 늘 나랏일을 근심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선대의 뜻과 사업을 계술(繼述)하는 방법만을 생각하셨다. 그리하여 모든 신하가 화합하여 드디어 대도(大道)가 행해지는 세상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니 진실로 선왕의 업적을 만분의 일이라도 선양할 수 있다면 후대 임금의 귀감이 되는 데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니, 보감의 편찬 작업은 늦추지 말고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예전에 미처 보충하여 편집하지 못한 것도 아마 오늘이 있기를 기다려서 그리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열두 임금의 빛나는 공덕과 훌륭하게 이어 오신 업적을 끝내 대서특필하여 세상에 널리 알리지 못한다면, 이것이 어찌 내가 왕위를 계승한 의미이겠는가.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에 기록되어 있는 성왕(成王)과 주공(周公)이 풍송(諷誦)하고 권계(勸戒)한 내용을 보면 주로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일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많다. 그러나 또 반드시 태왕(太王)과 왕계(王季)에까지 소급하여 언급하였고 공류(公劉)와 후직(后稷)의 자취까지도 언급하고 있으니, 이는 자기 조상의 덕업을 모두 알려서 후세에 널리 귀감이 되게 하려는 생각에서였던 것이다. 그러니 나라고 해서 어찌 감히 가까운 조상만을 선양하고 먼 조상은 소홀히 하겠는가. 그리하여 관각(館閣)의 신하들에게 지시하여 열두 분 임금의 실록에서 뽑아내어 분류해서 편찬하도록 하였더니, 이듬해 3월에 일이 모두 끝나 열두 임금과 선대왕의 보감이 모두 다 완성되었다. 그리하여 4조(朝)의 보감과 선묘(宣廟)와 숙묘(肅廟)의 보감을 하나로 통합하고 세대 순으로 편차(編次)하여 전체를 묶어 《국조보감(國朝寶鑑)》이라고 이름 하니, 모두 68권이다.
나는 삼가 이 책을 받아 읽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 참으로 훌륭하고 또 빠진 것이 없구나. 조선조 400년간의 심법(心法)과 전장(典章)이 모두 여기에 담겨 있도다. 학문을 익히고 덕(德)을 닦는 요체와 하늘을 공경하고 조상을 높이는 실상 및 경비를 절약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교육을 장려하여 풍속을 바로잡는 방법에 대하여 열성조(列聖朝)가 서로 전해 온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하였으니, 그 공업(功業)과 덕화(德化)가 크게 빛나서 해와 달처럼 환하게 천지에 가득하여 장차 끝없이 전해지면서 세월이 갈수록 더욱 빛날 것이다. 이는 선대왕이 뜻하시던 것이 이제야 이루어진 것이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아, 이 책에서 선대왕의 심법을 체득하고, 선대왕의 전장을 닦아서 밝게 하고, 이어서 열성조의 심법과 전장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열성조와 선대왕이 내게 물려주신 것을 실추시키지 않고 나의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마치 천도(天道)에 사시(四時)가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열성조가 이룩한 성덕(盛德)과 대업(大業)은 명철(明哲)한 신하들이 좌우에서 도운 힘이 컸던 것이다. 더구나 어리석은 나는 힘써 보좌하는 여러 신하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게다가 이전에 임금을 보좌하였던 신하들은 또한 지금 조정에 벼슬하는 신하들의 할아비나 아비였다. 이제 그들의 훌륭한 계책들이 이 책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니, 이 책이 어찌 나 한 사람에게만 귀감이 되겠는가. 《시경》에, ‘아, 황왕(皇王)이시여. 당신들이 이룬 왕업의 실마리를 계승할 것을 잊지 않겠나이다.[於乎皇王 繼序思不忘]’ 하였고, 또 이르기를 ‘내게 지워진 이 임무를 돕는 뜻에서 그대의 밝은 덕행을 내게 보여 주라.[佛時仔肩 示我顯德行]’ 하였으니, 우리도 서로 돕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마침내 이것을 써서 서문으로 삼는다.
[주D-001]《보훈(寶訓)》을 …… 삼은 것 : 송 철종(宋哲宗) 원우(元祐) 4년(1089) 10월에 황제가 이영각(邇英閣)에 가서 강관(講官)에게 《삼조보훈(三朝寶訓)》을 진강(進講)하도록 하였다. 《宋史 卷17 哲宗本紀》
[주D-002]아 …… 않겠나이다 : 주 성왕(周成王)이 복상(服喪)을 끝내고 처음으로 선왕(先王)들의 사당을 찾았을 때 부른 것으로, 《시경(詩經)》 주송(周頌) 민여소자(閔予小子)에 나온다.
[주D-003]내게 …… 보여 주라 : 성왕(成王)이 여러 신하들의 경계하는 말을 듣고서 지은 것으로, 《시경(詩經)》 주송(周頌) 경지(敬之)에 나온다.
자료/고전번역원
|